사법 권력과 민주주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본 글은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 『사법 쿠데타의 시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시사 칼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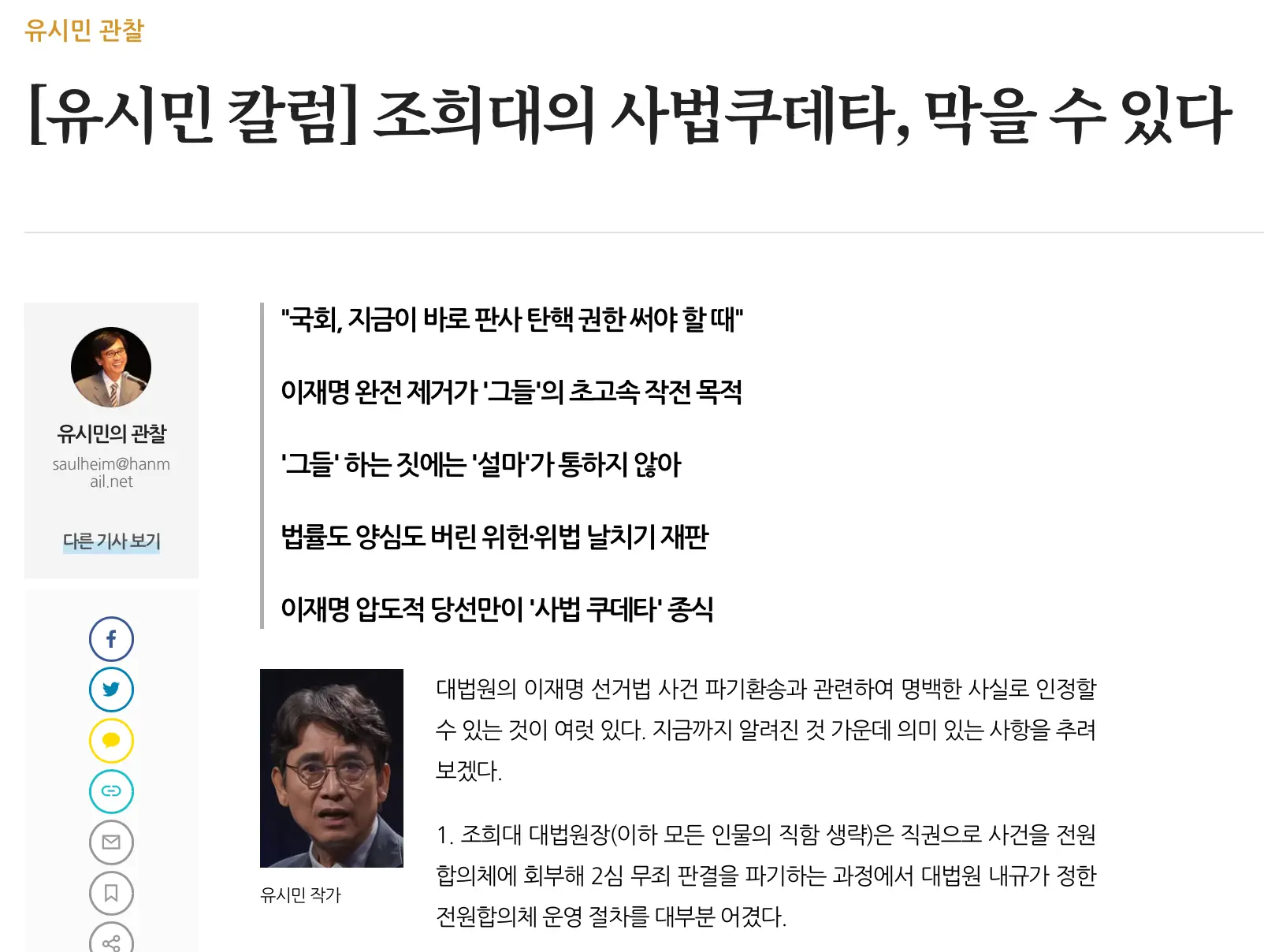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주요 논지 요약
- 대법원의 절차적 위법 주장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있어 자체 내규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주장.
- 1심 판결문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독립적 법리 검토가 없었다는 비판.
-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
-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판결을 날림 처리했다는 주장.
- 특히 대선 일정에 맞춘 듯한 빠른 진행은 정치적 개입의 정황으로 지목됨.
- ‘그들’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 강조
- 파기환송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지목하여 “사법 쿠데타” 세력이라 표현.
- 헌법 제11조,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탄핵 필요성 주장.
- 국회의 대응 촉구
- 판사 탄핵 권한을 가진 국회가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 플랜B (이재명 외 대타 후보론)는 사법부에 굴복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배제.
민주주의, 당연한 듯 취급되던 것의 균열
민주주의는 때로 공기와 같습니다. 늘 존재한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냄새가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낍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사법적 사건들은 그런 불길한 기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의 조정이며, 사법은 법의 이름으로 그 갈등을 중재하거나 판결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정치가 사법을 길들이려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사법 권력은 견제되어야 할 권력인가
대의민주주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이고, 행정부는 그 입법에 따라 통치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그 사이를 조율하며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사법부는 이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이나 인사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가장한 ‘개입’ 혹은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더 이상 법률의 해석이 아닌 정치적 의사를 대리하는 수단이 되어간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지적: 사법 쿠데타는 가능한가
유시민 작가는 민들레 칼럼에서 ‘사법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력화 시도, 검찰 내부의 권한 집중, 법원 내 특정 판결 경향 등이 그러한 흐름의 일부라고 분석합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법해석이나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체제의 전환을 꾀하는 위험한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지 하나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내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헌법 정신의 진정한 수호자는 누구인가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지만, 그 권한은 헌법에 의해 위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헌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1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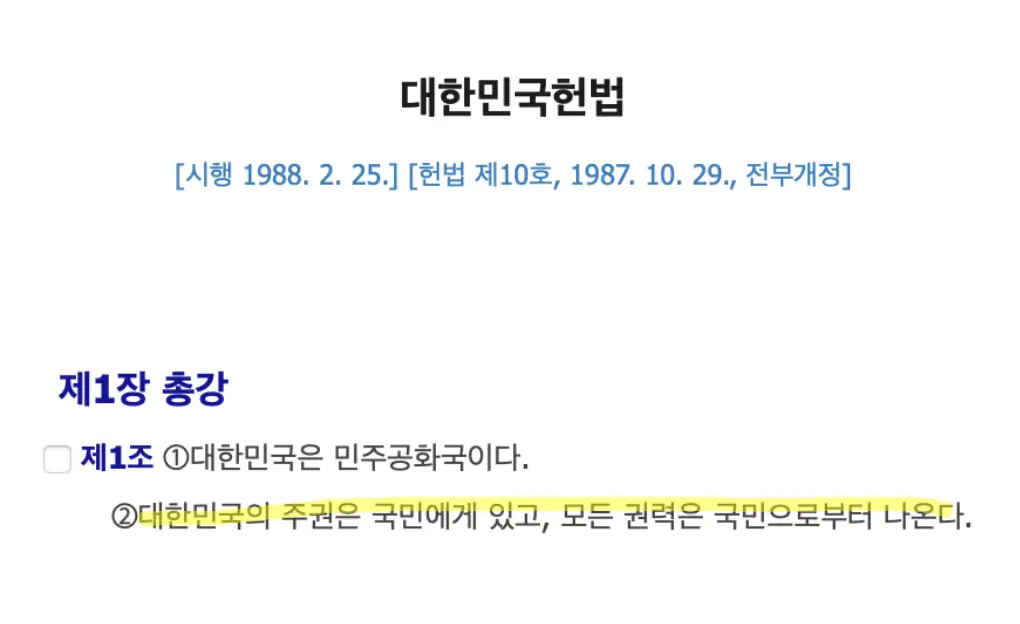
그렇다면 국민의 뜻은 어디에 반영되는가? 바로 국회와 선거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사법부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제약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 불리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단지 정치적 오해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 사법부는 중립적 심판자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권력인가?
- 검찰은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인가, 정치 권력화된 조직인가?
-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권력이 시민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칼을 휘두르는 풍경을 수없이 보아왔고, 이제는 법원이 그 칼을 대신 들고 있다는 인식마저 듭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불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편들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정의로운가를 묻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시민의 최소한의 역할일 것입니다.